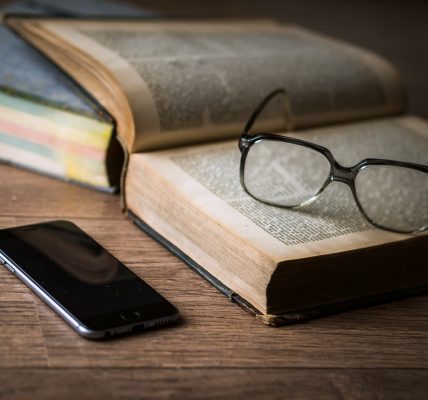미술 작품은 단순히 캔버스 위에 그려진 이미지나 조각된 형태를 넘어, 그 시대의 역사와 권력,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벌어진 원주민 예술가들의 증강현실(AR) 시위와, 360년 된 명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모델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바로 이 ‘서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점거한 증강현실 예술
미국 ‘원주민의 날’이었던 지난 10월 13일, 17명의 원주민 예술가들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하 메트) 미국관에서 전례 없는 방식의 비공식적 예술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19세기 미국 풍경화, 부유한 정착민들의 초상화, 그리고 웅장한 역사화 위에 원주민의 우주론적 형상, 전통 춤을 추는 무용수, 혹은 질식할 듯한 담쟁이덩굴 이미지 등을 디지털로 덧씌웠습니다.
‘암호화된: 이야기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ENCODED: Change the Story, Change the Future)’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비영리 미디어 디자인 랩 ‘앰플리파이어(Amplifier)’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위는 메트 미국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맞춰 기획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술가들은 “미국 미술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무엇을 전시할 가치가 있는지 누가 결정하는가?”, “미술관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예술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미술관의 한계와 예술가들의 목소리
물론 메트 또한 최근 몇 년간 원주민 예술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에는 최초의 원주민 예술 담당 큐레이터로 패트리샤 마로킨 노비를 고용했고, 2021년에는 50개 이상 부족의 작품 139점을 포함한 디커 컬렉션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미국관의 한쪽 구석에 분리 전시되었으며, 올해 초 열린 오지브웨 부족 출신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지 모리슨의 회고전 역시 헬렌 프랑켄탈러나 잭슨 폴록과 같은 동시대 뉴욕 화가들의 작품과 분리되어 전시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틀링깃 및 우낭가스족 예술가 니컬러스 갈라닌은 “미술관과 같은 기관은 자신들이 대표하거나 문화를 가져온 공동체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서구에 의해 자행된 원주민 문화재 약탈은 정당화되는 반면, 원주민이 같은 방식으로 문화재를 되찾으려 하면 범죄화되는 이중 잣대를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디커 컬렉션의 원주민 작품 139점 중 단 15%만이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갈라닌은 “미술관들은 정말 원할 때는 얼마든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며 기관의 변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논쟁: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정체
이처럼 작품에 담긴 서사를 재해석하고 도전하는 움직임은 현대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 세기 전의 걸작을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1665년 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미술사학자 앤드루 그레이엄-딕슨은 최근 자신의 저서 ‘페르메이르: 잃어버리고 찾은 삶’을 통해, 그림 속 소녀가 페르메이르의 주된 후원자였던 피터르 클라스준 판 라위번의 10대 딸, 막달레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르메이르와 그의 후원자 가족은 급진적인 기독교 분파인 렘브란트파의 일원이었으며, 이들은 예수의 추종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림 속 소녀가 막달라 마리아를 상징하는 이국적인 터번과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시 10대였던 막달레나가 그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매력
물론 그레이엄-딕슨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특정 인물을 그린 초상화가 아니라, 상상 속 인물이나 특정 유형의 인물을 표현한 ‘트로니(tronie)’라고 주장합니다.
‘뮤즈: 미술사 걸작 뒤에 숨겨진 인물들’의 저자 루스 밀링턴은 “이 그림의 매력은 바로 뮤즈의 미스터리함 그 자체에 있다”며, “작품을 너무 전기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림에는 그보다 더 복잡한 층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작가 트레이시 슈발리에 역시 “이 이미지가 힘을 갖는 이유는 미완결성에 있다”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코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19세기 그림에 새로운 서사를 덧씌우려는 원주민 예술가들의 시도와, 17세기 걸작의 감춰진 인물을 밝혀내려는 한 역사학자의 주장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예술 작품의 해석과 그 서사를 누가 소유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